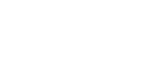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 등록일
2025-06-25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変化する中国の一帯一路 ―「量から質への転換」の実像―”
|
저자 |
佐野淳也 |
|
|---|---|---|
|
발행기관 |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
|
|
발행일 |
2025년 5월 13일 |
|
|
출처 |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가 5월 13일 발표한 “変化する中国の一帯一路―「量から質への転換」の実像―”는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라는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실상을 진단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에 제안한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출범 이후 약 10년간 중국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초기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Rebalance)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라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였다. 당시 중국은 과잉생산 설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자국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다극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이라는 공식 문건을 통해, 지리적 범위를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남태평양·중남미까지 확장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6대 경제회랑 구상을 제시하며 양적 확장을 가속화하였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과도 제3국 시장 협력을 추진하며 서방과의 협력도 일정 부분 꾀하였다. AIIB 창립은 이러한 개방 전략의 대표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양적 확장 중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신흥국 대상 대외융자의 부실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채무재조정이 발생하였고, 둘째, 위안화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대내외 경제 둔화는 재정적 여유를 줄였다. 셋째, 국내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중시하는 내정 우선 기조는 해외 팽창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방의 협력은 단절되고 오히려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총체적 제약 속에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전략 수정을 모색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 ‘질의 고도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BRI 제안 5주년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처음으로 “질 높은 발전”을 강조하며 ‘작지만 실속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 지향,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현지 수요 반영을 주문하였다. 2021년 11월의 제3차 BRI 건설 좌담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내부적으로 제시되었고, 2023년 10월의 제3차 BRI 국제정상포럼에서는 대외적으로도 공식 선언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제시한 8개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육해공 물류망 고도화, ②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③ 실무적 협력 증진, ④ 환경친화적 발전, ⑤ 과학기술 혁신, ⑥ 민간 교류, ⑦ 컴플라이언스 강화, ⑧ 국제협력 메커니즘 개선. 특히 ‘작지만 훌륭한 국민생활 지원 프로젝트’(小而美), 디지털 및 녹색 협력, 직업교육 및 로컬 인력양성 등이 중점으로 부각된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수주에서 소프트파워와 사회 인프라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질적 전환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상 국가와 지역의 전략적 선별 강화이다. 더 이상 모든 국가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자원 확보, 생산기지 이전, 핵심 수출시장 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그린 경제 지원의 확대이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신흥국의 녹색수요에 대응하며, 이를 대외 이미지 개선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한 친중 감정 고양이다. ‘루반공방’과 같은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중국어 교육, 기술이전,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반중 여론을 완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수주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실크로드 확대이다. 통신 인프라,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데이터 협력 등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전환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이후 대외융자 및 약속액 규모는 2013~2018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국가 수의 선별과 프로젝트 성격의 변화로 이어졌다. 직업훈련 프로젝트와 디지털 분야의 협약은 다소 증가한 반면, 녹색경제 협력은 아직 실질적 성과가 미진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전면 확장’에서 ‘전략적 집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재정적 제약, 국내 우선 정책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대외 전략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현실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외부 환경 변화, 특히 트럼프 2기 집권기 등 예측불가능한 국제정세는 중국의 BRI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질적 전환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인프라 중독에서 벗어나 실질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