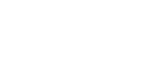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 등록일
2025-06-25
“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中国の政治体制と経済発展の限界ー習近平政権の課題”
|
저자 |
湯浅健司 외 |
|
|---|---|---|
|
발행기관 |
일본경제연구소(JCER) |
|
|
발행일 |
2025년 5월 27일 |
|
|
출처 |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5월 27일 『中国の政治体制と経済発展の限界ー習近平政権の課題』의 요약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총 9개 장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시진핑 체제하에서 노정된 체제 내 모순과 한계를 조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덩샤오핑 시기의 '집단지도 체제'에서 시진핑 1기 이후 급격히 중앙집중적이며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통제체제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결과, 정책 오류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책 실패의 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시장의 자율성과 제도 신뢰의 약화로 이어진다.
2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경제 전략의 변화가 다뤄진다. 미국의 기술제한과 공급망 분리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관계 강화, 일대일로 재정비, 아세안·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용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무역·금융 질서에서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3장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축이 집중 조명된다. 당국은 2020년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고, 이는 시장의 혁신 역동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민간 주도 대기업은 사실상 당의 통제 아래 놓였고, 고위험 창업에 대한 금융과 인력의 유입이 급감하면서 ‘두뇌 유출’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4장에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개념을 실증 분석한다. 일본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거점을 아세안이나 인도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규제 집행, 민감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강화는 외국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5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2021년 이후 중국의 주택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디폴트 사태가 시장의 전반적 신뢰 붕괴를 유발했다. 정부의 정책 개입은 일시적 유동성 지원에 그쳤고, 미완공 주택 정리, 디벨로퍼 구조조정, 지역정부 채무 처리 등 근본적 개혁은 지연되고 있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6장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이 조명된다. 중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사회보장 체계는 지역·계층 간 격차가 심각하다. 도시 근로자와 농촌 인구,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간의 연금 수령액 차이는 크며, 의료보장도 통합되지 않았다. 이는 노년층의 소비 위축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수 기반 확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장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고등교육 이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디지털·게임·인터넷 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채용 축소로 인해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험 없는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진입 경로가 사라지면서 '경험 없는 실업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래 노동생산성 약화로 직결된다.
8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후퇴가 다뤄진다. 1990년대 추진되었던 '전략적 개편' 기조는 점차 소멸되었고, 시진핑 체제는 국유기업을 전략산업의 ‘수행 도구’로 재정의하였다. 국유기업은 공공 서비스 제공보다는 당의 정책 목적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은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고 경쟁 환경도 왜곡되고 있다.
9장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 전략이 소개된다. 3기 체제 들어 ‘식량안보’는 헌법 수준의 정책 목표로 격상되었으며, 곡물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집단소유제의 고수, 농촌진흥 기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며, 중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외교적 고립은 모두 정치체제의 구조적 경직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내린다. 시진핑 정권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단순한 '경제활력 회복'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의 비효율성과 권력 집중이 초래하는 정책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개혁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