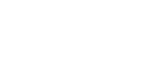전략적 자율성의 모색: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
- 등록일
2025-07-30
“전략적 자율성의 모색: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Europe grapples with the US-China rivalry”
|
저자 |
Mario Esteban 외 |
|
|---|---|---|
|
발행기관 |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
|
|
발행일 |
2025년 6월 26일 |
|
|
출처 |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ETNC(European Think-tank Network on China)가 발간한 “The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Europe Grapples with the US-China Rivalry”는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을 탐색한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 21개국의 대중국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고, 각국이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2025년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원래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기술, 공급망, 경제안보, 외교정책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위치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발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21개 유럽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포르투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의 대중 정책과 미중 경쟁에 대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국가들이며, 유럽 내 리더십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일방주의나 중국의 권위주의 모두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다자주의와 유럽 중심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de-risking)를 강조하되 전면적인 탈동조화(decoupling)는 지양하고 있다.
반면, 중앙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보다는 대서양주의(미국 중심 질서)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안보 위협(특히 러시아) 인식과 직결되어 있다. 예컨대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등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또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요소로 삼는다. 이에 따라 EU의 전략적 자율성 담론에 다소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가치와 이익 사이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유지와 동시에 유럽의 가치 기반 외교를 수호하려 하며, 핀란드·스웨덴 등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통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유럽 주도권 강화를 지지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럽은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가?”라는 핵심 질문을 제기하며, 유럽 내부의 전략적 정렬(divergence)이 지속될 경우 EU 차원의 통합된 대중 전략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특히, 단일시장·통상정책 차원의 공통 대응은 가능하지만, 외교안보 및 가치 기반 전략에 있어서는 국가별 이질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미중 경쟁 속에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제약 속에서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첫째, 유럽 내부의 이해 일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조정 메커니즘 강화, 둘째, 기술·산업·공급망 차원의 공동 전략 수립, 셋째,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실질적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자율성 강화이다.